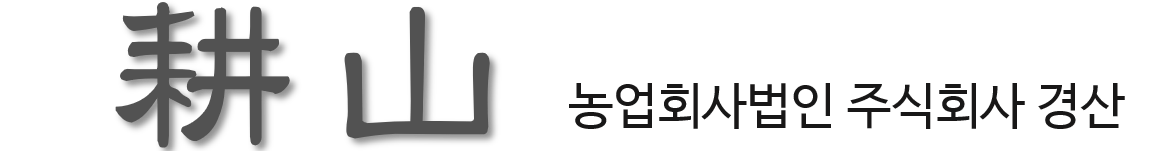지정환 신부
삼월은 봄의 길목에서 새싹을 틔우고 꽃을 맞이하는 때이다. 희망을 상징하는 이 시기 봄처럼 우리 곁에 온 사람이 있다. 임실 치즈로 유명한 지정환 신부이다. 본명이 디디에 세스테벤스(Didier t‘Serstevens)인 그는 삼월 전주에서 ‘지정환’이란 한국이름을 얻으며 우리와 인연을 맺었다. 1931년 벨기에의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유복한 환경에서 자란 그였지만, 고등학교 때 극장에서 본 한국전쟁의 참혹한 영상이 운명처럼 그를 한국으로 이끌었다. 당시 가장 위험한 나라로 떠나는 그를 주변에서 말렸지만, 전쟁으로 피폐해진 한국에 희망을 주고자 사제가 된 다음 해에 제노바에서 배를 타고 2달 만인 1959년 12월 전쟁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부산항에 도착했다.
1960년 3월 첫 발령을 받아 전주교구 전동성당에 온 그는 본명 ‘디디에’의 발음과 비슷한 ‘지’를 성으로 하고, 전주교구의 김이환 신부의 이름 ‘환’을 따 ‘정의가 환하게 빛난다’는 ‘정환’이란 이름을 받아 훗날 ‘임실 지씨’의 시조가 된다. 1961년 주임신부로 발령을 받아 간 부안은 농촌이지만 농사지을 땅이 부족해 선교보다는 배고픔을 먼저 해결해 줘야 하는 곳이었다. 마침 부안은 정부주도로 간척사업을 하고 있어 주민들을 설득하고 간척허가를 받아 바닷물을 막고 농지로 만드는 고된 작업을 함께 한다. 무리한 탓에 건강 이상이 생겨 담낭 제거 수술을 받으면서도 3년 만에 100ha(약 삼십만 평)의 땅을 만들어 한 가구당 약 3천 평씩 100가구가 나누게 되었다. 스스로 “나는 쓸개 없는 사람이여”라고 농담하는 지신부는 농부들에게 땅이 생겼으니 잘 살꺼라 안심하며 요양차 벨기에로 떠났다.

약탕기를 사용해 치즈를 만드는 지정환 신부.
그러나 6개월 후 돌아와 보니 많은 농가가 땅을 팔거나 더러는 노름으로 땅을 잃어 피땀으로 일군 부안간척사업은 실패나 다름없었다. 간척지의 특성상 염분 때문에 벼가 죽기까지 하자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든 농민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땅을 처분한 것이다. 부안의 실정에 실망하던 중 1964년 임실 성가리 ‘소나무집’이라는 작은 임시성당의 주임신부로 발령받았다. 그러나 그가 도착한 임실도 당시에는 민둥산에 풀만 자라는 척박한 농촌이었다. 우연히 만난 당시 문필병 임실군수는 “신부님! 이곳을 떠날 땐 가난한 임실을 위해서 뭔가를 남겨 주세요!”라는 부탁을 한다. 그 간절한 당부에 고민에 빠졌던 지신부는 삼례의 오기순 신부가 선물한 ‘산양 두 마리’를 시작으로 임실 치즈의 역사를 쓰게 된다.
10여 명의 마을 청년들과 함께 산양의 젖을 짜고 사육 두수를 늘리며 협동조합을 설립했지만, 곧 난관에 봉착했다. 산양유에 대한 선호도가 낮아 판매도 힘들고 온도에 민감한 산양유가 쉽게 상했기 때문이다. 그 처리를 고민하던 지신부는 치즈를 떠올렸고 치즈를 모르는 청년들에게 “치즈는 두부 같은 거여”라며 함께 치즈 만들기에 도전한다. 산양유를 굳히면 치즈가 되는 줄 알고 약탕기와 비눗갑을 사용해 두부를 만드는 간수도 넣어도 보고 누룩도 넣어봤지만, 치즈는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벨기에에서 가져온 응고제를 발견하고 치즈를 만들게 된다. 본격적인 치즈 상품화를 위해 첫 번째 공장을 주민들과 함께 짓고 두 번째 공장은 벨기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지었다. 사실 그가 한국의 농촌에서 치즈를 만들고 공장을 짓는다 하자 가족들은 “치즈를 좋아하지 않는 디디에가?”라며 의아해했지만, 지신부를 믿고 지원해 주었다.
하지만, 균등한 품질의 치즈 생산에 실패하자 핵심기술을 배우기 위해 유럽으로 건너갔다. 벨기에와 프랑스의 치즈공장을 돌다 기적적으로 이탈리아 장인에게 비법을 전수 받고 이를 수첩에 빼곡히 적어 석 달 만에 임실로 돌아온다. 그러나 그사이 주민들은 양을 처분해버렸고 홀로 남은 청년 신태근과 비법을 적어온 수첩을 보며 마침내 1969년 균일한 맛과 향을 지닌 치즈를 만든다. 이후 다시 뭉친 주민들과 공장 뒤편에 있는 산에다 정과 망치만으로 굴을 파 숙성기간이 긴 치즈를 만들었지만, 한국 사람에게 낯선 치즈의 수요는 적었다. 고민에 빠진 신부는 직접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 서울로 가 외국인이 많이 머무는 호텔과 한국최초의 피자가게를 찾아갔다. 외국인 신부와 농부가 만든 신선한 치즈에 대한 호기심은 이내 그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산양유가 부족할 정도로 주문이 쇄도했다.

완주 지정환 신부의 방과 집명판.
많은 양의 치즈가 필요해지자 산양 대신 젖이 풍부한 젖소를 기르게 되었고 이는 오늘날 임실치즈의 토대가 된다. 임실치즈가 자리 잡는 사이 ‘다발성신경경화증’이라는 병이 생긴 지신부는 치료차 벨기에로 떠나며 모든 권한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공수신퇴(功遂身退)”란 말을 남긴다. 그가 평소에 존경한 노자의 “공을 이루었으면 미련 없이 물러난다.”는 말을 실천한 것이다. 지신부의 산양 두 마리와 청년으로부터 시작된 임실치즈는 국내 치즈 산업의 자양분이 되고 임실 치즈테마파크와 축제의 자산이 되어 지역의 경제발전의 큰 축이 되었다. 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신부는 휠체어를 탄 채 완주 소양의 ‘별아래 집’과 전주의 ‘무지개 장학재단’을 오고 가며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사역을 맡았다.
2016년 정부로부터 공을 인정받아 한국 국적을 받은 지신부는 현재, 장애인들이 자립하고 사회와 만나는 것에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그들의 삶이 나아지는 데에 힘을 쏟고 있다. 그와 뜻을 함께하는 ‘임실치즈농협’, ‘지정환 치즈피자’의 체인점들은 매달 무지개 장학재단에 브랜드 사용료로 장학금을 기부하고 있고 ‘세영재단’과 그 사랑을 받은 ‘무지개가족’도 함께 기부하고 있다. 그의 방에는 ‘무지개가족’의 일원이 자립교육으로 동양화 자수를 배우고 나서 선물한 십자수 초상이 있다. “내 장례식에는 저 십자수를 영정으로 쓰고 노래 ‘만남’을 불러줘요”라는 말을 한다. 양띠인 그가 치즈를 만들고 장애를 겪으며 장애인과 함께하기까지 그 여정에 담긴 역경과 사랑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
지금까지 언제나 함께하고 나누는 삶을 이어가는 지정환 신부는 가장 소중한 것은 “지금”이라고 한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을 잘 해가는 것이 ‘기쁨이 되는 시간’이라고 담담하게 전하는 그의 말이 깊은 울림을 준다. 지금, 찬란한 봄이 열리는 삼월 우리 곁에서 함께 하는 지정환 신부가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그 발자취에 담긴 시간의 흔적을 존경하고 지금의 시간을 아낌없이 잘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며 봄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연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기사원문
'임실치즈산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범당골역사 (0) | 2020.07.03 |
|---|---|
| 임실치즈의 시작, 성가리에서... (0) | 2019.07.18 |
| [곽병찬의 향원익청] 왜 사느냐고 물으려거든… (0) | 2019.07.14 |
| 치즈로 사랑 빚은 벨기에 신부 (0) | 2019.07.14 |
| 신태근, 그의 꿈은 농촌을 서로 함께 사는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었다. (0) | 2019.07.14 |